과거 두산건설·두산중공업 부실로 유동성 위기
밥캣 PRS 계약 및 지분매각으로 유동성 확보
두산에너빌리티 덩치 커졌는데 총수 지분 0%대
지난해 밥캣-로보틱스 합병 논란…최근 M&A로 방향 전환

[뉴스포스트=최종원 기자] 최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문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한 SK㈜의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이 금융투자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연결 기준 순차입금을 크게 줄이기 위한 SK이노의 2조원 유상증자에 SK㈜는 4000억원을 직접 출자하기로 했고, 다수의 금융기관과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하며 1.6조원의 제3자 유상증자도 결의했다.
PRS는 정산 시기에 기초자산인 주식 가치가 계약 체결 시점보다 높으면 차액을 조달 기업이 가져가며, 주가가 하락하면 기업이 투자자에게 손실분을 보장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이다.
다만 상품 자체는 채권 성격이 강한데 투자자(주로 증권사)들은 조달 기업으로부터 수수료(이자)를 수취하게 되고, 금리도 5~6%에 달해 일종의 주식담보대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회사 두산건설·두산중공업의 잇따른 수주 실패로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두산그룹을 살려낸 것도 PRS 계약이다. 수조원의 가격으로 인수한 밥캣 지분을 토대로 여러 증권사와 PRS 계약을 맺어 현금흐름을 확보했고, 주가 또한 상승하며 추가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두산 살려낸 밥캣 인수…PRS 성과에 매년 1조원 가까운 영업익

두산그룹의 밥캣 인수는 한때 '승자의 저주'로 평가받았다. 현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인프라코어가 2007년 7월 미국 건설기계 회사 밥캣을 49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4.52조원)에 인수했는데, 이듬해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유동성이 감소하며 '계륵'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인수금액도 한국 기업의 해외 M&A(인수·합병) 사상 최대라 두산이 감당하기 어려웠고, 잇따른 손실로 인수금액 회수도 난항을 겪었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밥캣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두산건설 미분양 사태와 석탄발전 침체 등 두산에너빌리티의 사업 난항으로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두산건설을 상장폐지시키는 대신, 두산건설 주식을 두산에너빌리티 신주로 교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차입금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2021년 사모펀드 산하 투자목적회사 '더제니스홀딩스'에 250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신주 발행)를 결의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차입금 상환을 위해 밥캣의 지분도 활용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8년 8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4곳의 증권사와 PRS 계약을 맺어 두산밥캣 지분 10.55%(1057만8070주)를 약 3681억원(주당 34800원)에 매각했다. 의결권·배당 등 모든 권리를 증권사에 매각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기회는 남겨뒀다.
만기 정산일은 2019년 12월이었지만, 4차례 이상 계약을 연장해 정산 시점을 뒤로 미뤘다. 최종적으로 지난 2023년 3월 증권사들이 주당 3만6600원에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남은 주식을 모두 매각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증권사들은 2022년 11월에도 500만주(4.9%)에 대한 블록딜을 단행하며 주가 상승 리스크를 줄였고, 매각차익은 두산에너빌리티에 지급했다.
'총수 지분 0%대' 두산에너빌리티 의존 심화…M&A로 ㈜두산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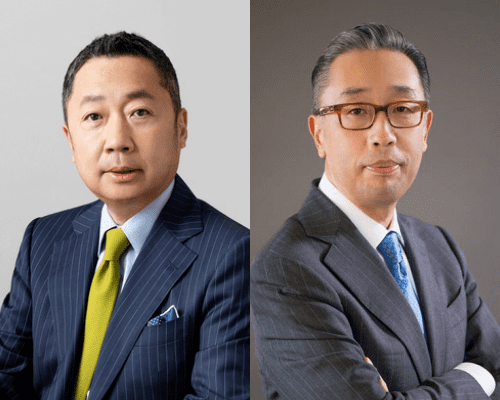
두산에너빌리티는 PRS에 이어 두산밥캣 지분 500만주(5%)를 블록딜로 2995억원에 매각했고,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인프라코어) 매각이익(약 8500억원)과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선수금을 수령하며 유동성을 더 확보했다. 밥캣은 매년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으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별도기준 순차입금은 2019년 말 4.5조원 수준에서 2024년 3월 말 2.5조원까지 크게 감소헸고, 지난해 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6.2조원, 1조176억원에 달한다.
두산에너빌리티 부활에 힘입어 두산그룹도 2022년 2월 채권단 관리에서 벗어나며 상황이 많이 호전됐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자회사 포트폴리오는 부실한 편이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시장 침체에 지난해 영업손실이 412억원으로 적자 폭이 115% 늘었다. 반도체 테스트 기업 두산테스나도 올해 1분기 영업손실 191억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 ㈜두산 지분구조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7.72%) 등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40.11%다. 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특수관계인 지분이 0.5%도 되지 않아 지배력이 약한 편이다. ㈜두산의 두산에너빌리티 지분도 30.39%로 자회사 요건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라 경영권 방어 수단이 취약하다.
지배력 강화를 위해 두산은 지난해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에 0.63:1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지만, 두산밥캣 주주들의 큰 반발과 금융감독원 정정 요구 등 논란이 심화되자 결국 합병을 철회한 바 있다. 두산밥캣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분이 48.17%일뿐 ㈜두산과 총수 일가 지분은 전무하다.
최근엔 지배구조 개편 대신 M&A로 방향을 바꿔 매물을 파악하고 있다. 두산(연결 기준)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올 1분기 기준 3.1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3.84조원) 대비 18% 가까이 줄긴 했지만, M&A를 단행하긴 충분하다는 평가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로봇 시스템 통합 및 첨단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원엑시아'의 주식 인수와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지분 89.59%(약 356억원)를 확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