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 하며 공동체 행사로 치르던 장례식,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산업으로 성장
[뉴스포스트=강대호 기자] 지난 한 주간 여러 장례식에 참석했다. 친구 부모님들과 친척 아저씨의 장례였다. 친구 부모님들은 그분들이 살던 곳 인근 병원 장례식장에서, 아저씨는 경북 한 도시의 전문 장례식장에서 이승에서의 마지막 통과의례를 치렀다.
병원에 입원해서 각종 노환 치료를 받다 사망한 친구 부모님들과는 달리 아저씨는 경북 어느 도시의 면 소재지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그 역시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집에서 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다는 염원에 따라 퇴원했었다. 하지만 사망 후에는 다시 도시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친구 부모님들의 장례식장과 친척 아저씨의 장례식장은 모두 다른 곳에 있었고 규모도 달랐다. 하지만 빈소의 구조와 문상객에게 제공되는 식사 메뉴는 거의 비슷했다. 공통점은 또 있었다. 모든 빈소에 어깨에는 견장을, 가슴에는 명찰을 단 상조회사 직원들이 상주했다는 점이다.

상부상조는 관혼상제에서의 중요한 덕목
우리나라는 상부상조의 전통이 있다. 누구에게나 닥치는 관혼상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중요한 덕목이었다. 장례는 특히 마을 단위로 계(契) 조직을 갖춰 함께 치르는 통과의례였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계를 통해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십시일반으로 마련하거나 마을 단위로 장례용품과 상여를 준비해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전이야 마을 어른이 호상(護喪, 초상 치르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을 맡아 다 알아서 해 주셨지. 그런데 모두 도시로 나간 지금이야 호상 맡을만한 사람이 없잖아. 그 모든 절차 아는 어른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아저씨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들의 말을 종합했다. 예전에는 장례식이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장소와 인력 때문에 더 그렇다고.
“문상객들이 거의 다른 도시에서 오는데 시골집보다 도시의 장례식장이 더 편하잖아. 그리고 음식 장만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고. 이 모든 걸 모두 상조회사에서 다 해주잖아.”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만큼은 마을 공동체가 치른 전통이 남아있던 모습에서 장례식의 산업화가 깊어짐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점은 친구 부모님들 장례식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함께 문상하던 지인들의 주된 대화 주제로 서로의 부모님 안부 못지않게 상조회사 가입 여부가 많이 언급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기자가 방문한 장례식장의 빈소는 물론 다른 빈소들에도 상조회사에서 나온 장례지도사들이, 화장장에는 상조회사 이름을 한 영구차와 리무진이 즐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2021년 7월 7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는 모두 75군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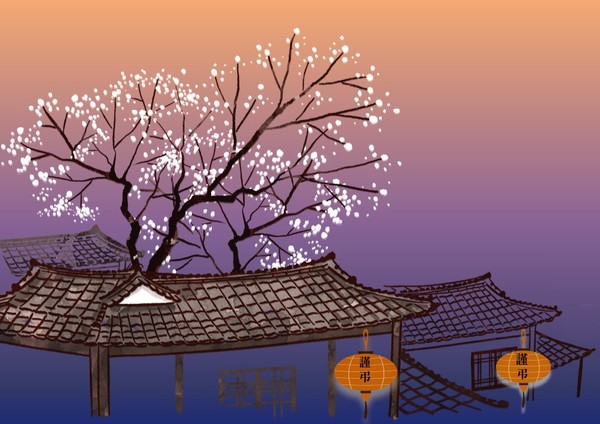
도시화와 핵가족이 이끈 장례식의 산업화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은 장례 문화에도 영향을 준다. 도시로 떠난 사람들은 핵가족을 이루며 다른 핵가족들을 이웃에 두고 산다. 이들에게도 장례는 피할 수 없는 통과의례다. 이때 ‘장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향 마을에서는 이웃 어른들이 장례를 도맡아 했었지만.
장례 관련 연구에서 장의사를 언급한 논문이 다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일제강점기인 1912년의 ‘공동묘지 제도와 화장문화정책’, 그리고 1932년의 ‘의례준칙’에 의한 ‘도시형 상례’ 덕분에 장의사라는 직군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 자료에 의하면 1952년에 장의사는 전국에 10곳이었다. 1954년에는 28곳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52년에 서울에는 장의사가 한 곳도 없었지만 1954년에는 9곳으로 집계되었다.
우리나라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며 장의사도 함께 증가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장의사는 1980년 1,336개, 1985년 2,500개, 1990년 2,862개, 1993년에 3,407개로 꾸준히 증가한다. 장의사를 두고 장례식 산업의 기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장의사가 양적으로 증가한 원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과 '수의' 같은 전문 물품을 조달하고, '염습'과 같은 전문 절차를 잘 아는 장의사가 필요했다. 영구차 섭외도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에 병원을 중심으로 장례식장이 증가한다. 원래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었지만 1995년에 양성화된다. 병원 소속이 아닌 전문 장례식장도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을 꼽는다. 아파트는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덕분에 장례식장들이 기존 장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성장한다.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장례식장은 총 465개였고, 이중 병원 장례식장이 426개, 전문 장례식장이 39개소였다. 2008년 자료에는 전국의 장례식장이 총 839개로 증가한다. 이중 병원 장례식장이 575개, 전문 장례식장이 264개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 7월 현재 장례식장은 모두 1,000곳이 넘는다.
도시화와 핵가족은 가족과 친족,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주관하던 장례식을 전문가인 장의사, 그리고 전문 예식장인 장례식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했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 집단을 탄생하게 한다.
장례식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상조회사
여러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상조회사 출현의 배경으로 장례식장의 독과점 구조를 꼽기도 한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유족들의 상황을 악용한 업자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 불만이 쌓여가던 200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더 좋은 서비스를 내세운 상조회사들이 예비 유족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공격적 마케팅이 기존 장례식 산업의 질서를 흔들었다. 상조회사 등장 초기에는 장의사는 물론 장례식장과도 마찰이 많았다고 한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조회사의 기원을 1982년에 부산에서 영업을 시작한 P 상조회사로 본다. 당시 창업자가 일본에서 관련 일을 접했었다고. 이후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상조회사들이 늘어났고, 이런 경향은 다른 지역으로도 옮겨간다.
상조회사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공격적 마케팅과 함께 유족들에게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를 꼽는다.
“막상 일이 닥치니 경황이 없었는데 장례지도사가 싹 정리를 했어. 장례 절차는 물론 문상객 접대 메뉴까지.”
지난주 모친상을 당한 친구의 말이다. 오늘날 장례식장과 상조회사는 역할을 분담하며 윈윈하는 모양새다. 장례식장은 장소와 음식을 제공하고 상조회사는 나머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회사의 서비스는 장례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사전 상담으로 시작한다. 장례가 발생하면 모든 과정을 설계해주는 장례지도사를 파견한다. 발인 후 화장이나 안장 과정도 주관한다. 계약 조건에 따라 추모 영상과 같은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장례식이 규격화되고 산업화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상조회사가 호상(護喪) 역할을 맡는 거지. 예전에 장례는 마을에서 각자 역할이 있었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잖아.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 역할을 상조회사가 맡는 거고.”
친척 아저씨 장례에서 만난 다른 친척의 말이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사망자는 약 30만명이었다. 여기서 장례식 산업의 규모를 예상할 수 있다. 1인당 장례식 비용이 백만원이라면 3천억원이고, 천만원이라면 3조원으로 훌쩍 뛴다.
우리나라는 현재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 저출산 때문에 이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게 분명하다. 어쩔 수 없지만 장례식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의하면 2021년 7월 현재 정상영업하는 상조회사가 75곳이다. 하지만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된 상조회사는 274개다. 예전에는 공동체 장례에서 각자 역할로 상부상조하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안심할 수 있는 상조회사를 고르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참고자료
병원의 장례식장화와 그 사회적 맥락 및 효과 (장석만)
상조회사의 등장과 죽음의례의 산업화 (송현동)
현대 한국사회 전통 상례의 현황과 과제 (김시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