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한다→안 한다...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제도
부동산 폭등 주범으로 찍혔지만 실증적 증거는 없어
“등록 임대업자, 임대차 3법보다 더 주거안정에 기여”
부동산 패닉 시대. 최근 몇년 간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주거권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보험제도 등을 내놓지만 집주인vs세입자의 대결 구도는 여전히 첨예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늘 대결할 수밖에 없을까. 민간 임대업자를 포용하면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해주는 길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주택 공급에 있어 민간 임대주택이 담당하고 있는 파이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 가구는 888만 6922가구다. 같은 해 공공임대 주택이 166만 128호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18.68%를 차지한다. 단순 수치만 계산했을 때 나머지 무주택 임차 가구는 민간이 담당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주택 중 민간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가 잡혀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 임대업자의 양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업자 등록을 권장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17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4년 이상 임대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2021년까지)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최대 80%(8년 임대 시) 감면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70% 확대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그 결과 소규모 임대인들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대거 편입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1분기 기준 누적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등록 임대인 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혜택이 축소되고, 지난 5월에는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폐지’ 논의까지 나갔다. 민간 임대업자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세금회피의 수법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 양성화했던 등록 임대업자들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찍히게 됐다. 다만 등록 임대인 제도 폐지 논의는 임대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백지화된 상태다.
이미 정부에서는 2018년 9·13 대책과 2020년 7·10 대책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을 점차 줄여나갔다.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전히 막혔고, 다세대나 다가구, 원룸 등의 일반주택만 등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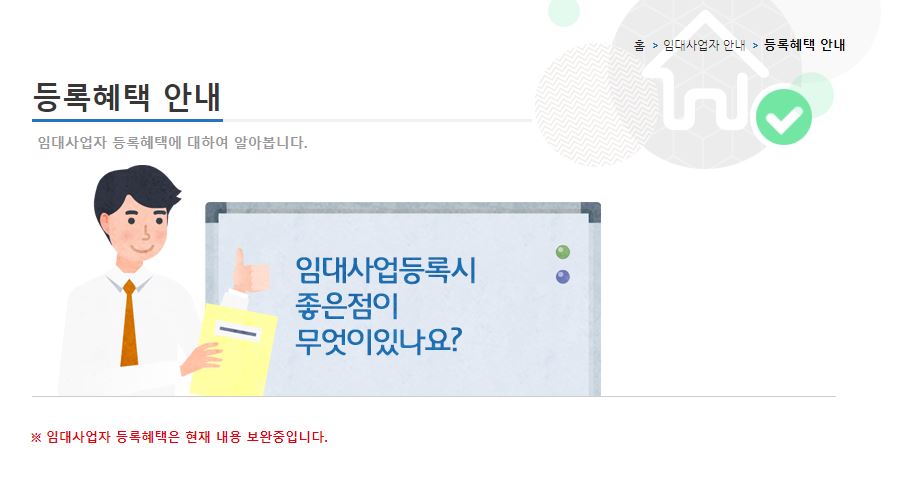
건강보험료 감면의 경우 이미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특례가 폐지됐고, 이전에 등록한 임대업자도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신규취득 시 합산 대상으로 변경됐다. 비 조정지역도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은 이미 지난해 부로 종료됐고, 건설임대주택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등록한 것까지만 적용된다.
억울한 임대인들 “아파트 비율 10%도 안 되는데”
임대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안 된다.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이기 때문에 현재의 아파트 가격 상승과는 무관하다는 게 임대업자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책기관 보고서에도 민간 임대주택 등록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민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에서 “다른 일각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이 집값을 올리는 주요 원인이라기보다는 급등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며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에 따른 비용은 임대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한 세수감소분 정도이며, 임대차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존재하므로 정책 효율성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보다 강력한 규제로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9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에서도 등록 임대업자의 물건이라고 하면 웃돈을 주고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현 임대차 3법은 최장 4년 거주를 보장하지만, 등록 임대업자들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무임대기간 내내 계약을 갱신하거나 5% 이상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자와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등록 임대사업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는 지켜야 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 회장은 “등록 임대업자들이 공급한 주택만 160만 호에 가까운데, 지난해 8월 기준 자동 말소된 주택이 50만 호, 자진 말소한 주택이 2만 호가 넘는다. 등록 임대 주택 3분의 1이 말소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느냐”며 “애초에 부동산 시장은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매매를 위한 정책을 임대주택에 적용하니 왜곡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대차 3법만 믿지 말고 민간 참여 늘려야
전문가들도 기존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정비하는 방향이 옳다면서도, 민간 임대업자들의 양성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토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서울과 같이 자가점유율이 현저히 낮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적은 지역에서의 민간 임대사업자의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임대주택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최소한의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취지는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공적으로 잘 관리하여 임대차 시장을 안정되게 하고 임차인도 보호하자는 것이므로 폐지보다는 중장기적 차원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